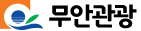멍수바위
- 작성일
- 2015.12.14 15:15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2805
무안군 일로읍 구정리에 가면 소댕이 목이 있습니다. 소댕이 곁으로는 영산강이 도도히 흐르고 있는데, 옛날 이곳은 바가 드나드는 초구였다고 합니다. 소댕이에서 바라다 보이는 강 한가운데에 뾰족한 바위 하나가 명상이라도 하는 듯 외롭게 서 있는데 이 바위를 멍수바위라고 부릅니다.
옛날 이 마을에서 땅 한 편 없는 가난한 과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과부에게는 애지중지 하는 외아들이 있었습니다. 과부의 외아들은 마음이 착하였으나 미련하고 바보스러워 어려서부터 마을 사람들은 멍수라고 놀렸으며, 결국 멍수는 그의 이름이 되고 말았습니다. 멍수네는 부쳐 먹을 땅이 한 평도 없기 때문에 그의 어머니가 영산강에 나가 갯바라지를 하여 저자에 파는 것이 두 식구의 유일한 생계수단이었습니다. 멍수 어머니가 굴을 따는 곳은 영산강 한 가운데 섬처럼 솟아있는 바위였습니다.
바위가 강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물이 들면 굴을 딸 수 없어 빠지기를 기다렸다가 멍수가 노를 저어 어머니를 모셔다 드리고 물이 들 때쯤이면 모셔 나오곤 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멍수는 여느 때와 같이 어머니를 바위까지 모셔드리고 집에 돌아와 보니 마을에는 큰잔치를 벌이고 있었습니다. 멍수는 잔칫집에 불려가 잔일을 거들어 주고 술과 음식을 얻어먹었습니다.
오랜만에 먹어보는 산해진미인지라 허리띠를 풀어 놓고 마음껏 먹어 포만감에 온몸은 나른하고, 취기가 올라 정신이 몽롱했습니다. 몇 시간이 흐른 뒤 번뜩 굴을 따는 어머니를 모셔와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 비틀거리며 강가까지 왔으나 그만 배안에서 잠이 들고 말았습니다. 굴을 따던 어머니는 아들 멍수가 나타나기를 애타게 기다렸으나 올 시간이 지나도 멍수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멍수야!” “멍수야!”
목이 터져라 아들의 이름을 불러보았으나 강 메아리만 처량히 되돌아올 뿐 멍수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뉘엿뉘엿 해가 서산에 지더니 이미 어둠이 깃들고 밀물이 점점 들기 시작했습니다. 멍수 어머니의 말목을 덮던 강물은 정강이에 차더니 차츰차츰 위로 올라옵니다. 고생하여 한나절을 따 담았던 굴 바구니도 밀려오는 물결에 휩쓸려 떠내려갑니다.
“멍수~야~아!” “멍수~야~아!”
울먹이며 피가 맺히게 멍수 이름을 불러봤지만 끝내 멍수는 나타나지 않고 어머니는 무심한 강 물결에 휩쓸려 목숨을 잃고 말았습니다. 뒤늦게 술이 깬 멍수는 있는 힘을 다해 노를 저었지만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어머니가 굴을 따던 바위는 밀물에 잠겨 흔적조차 없어졌고 이름 모를 물새 한 마리가 애도라도 하는 듯 섧게섧게 울며 지나갔습니다.
어머니가 운명하신 것을 알고 어머니를 부르며 대성통곡을 하였지만 한번 가신 어머니는 영영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멍수는 마을 사람들의 도움으로 시신을 찾아 장사를 지냈으나 장사 후에 어머니가 살아 계시어 바위꼭대기에 올라가 손을 흔들며 멍수 자기 이름을 부르는 듯한 환영에 잠겨 깨어나지를 못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멍수는 끼니를 전폐하고 날마다 강가에 나와 목이 터져라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아무리 불러봐야 다 쓸데없는 짓이니 집으로 돌아가서 어머니 명복이나 빌도록 하라고 충고하였으나 멍수는 바람이 부나 비가 오나 변함없이 강가에 나와 어머니를 부르다가 결국은 목에서 붉은 피를 쏟더니 한 많은 세상을 하직하고 말았습니다. 이때부터 마을 사람들은 이 바위를 멍수바위라 불렀으며 멍수바위는 지금도 변함없이 머리를 물위에 내놓고 바람이 심하게 부는 날이나, 비가 오는 날이면 어머니와 멍수의 피맺힌 외침이 비바람에 섞이어 울려오기도 한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