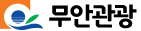운남의 사도세자당
- 작성일
- 2015.12.14 14:59
- 등록자
- 관리자
- 조회수
- 2825
조선조 제21대 영조대왕은 왕위에 등극한 후 42년 동안 나라를 다스리면서 많은 치적을 남기셨습니다. 탕평책을 써서 당쟁을 조정하고, 균역법을 제정하여 세금을 고루 매겨 민생을 돌보는가 하면, 대궐 문루(門樓)에 신문고(申聞鼓)라는 큰 북을 달아 백성들을 하여금 원통한 일을 하소연할 때 치도록 하였습니다.
영조는 후궁 정빈 이씨 몸에서 큰아들 경의군을 낳아 왕세자로 책봉하고 몹시 사랑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경의군은 요절하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빈 이씨 몸에서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을 새로이 왕세자로 봉했습니다. 영조는 자기 자신이 선왕의 서출(庶出)인데다 세자도 서출인 것이 늘 불안했습니다. 그런 불안 속에서 임금은 왕세자로 하여금 임금의 직무를 대리하도록 하고 자신은 좀 편안하게 지내려고 하였으나, 당시 권세를 잡고 있던 노론(老論)일당과 세자의 친누이 화완옹주와 영조의 젊은 후궁 문소의의 간계로 아버지와 아들 사이가 멀어지고 말았습니다.
조선시대에 영특하고 정치 잘한다는 칭찬을 받던 영조도 간신들의 감언이설에 빠져 판단이 흐리게 되었습니다. 사실과 다른 일에도 그들이 꾀를 내어 일러바치는 말이 사실처럼 들렸던 것입니다. 마침내 세자가 부왕 영조를 쫓아내고 왕이 되려 했다는 나경언등의 모함을 받았습니다. 임오년(1762) 윤 5월 영조 임금은 많은 병사를 풀어 성문과 각 궁궐 문을 닫도록 하는 등 철통같은 경계 속에서 손수 친국한 후 세자에게 관을 벗고 맨발로 고두케 하고 엄명을 내렸습니다. “네 죄를 속죄하려면 내린 칼로 네 목숨을 끊어라.” 세자는 울며불며 결백함을 아뢰었고, 열두 살 먹은 세손도 관과 도포를 벗고 세자 뒤에 엎드려 대죄했으나 임금은 비정하게도 세자를 뒤주 속에 넣게 한 후 손수 열쇠를 잠가버렸습니다. 때가 음력 윤 5월이라 뒤주 안은 찌는 듯 했습니다. 세자는 임금님의 노여움이 풀리면 밝은 세상을 볼 줄 알고 대소변까지 참으며 들어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소리를 버럭버럭 질렀습니다. “물 좀 다오!” “나를 구할 자가 아직 안 왔느냐?” “판부사는 어디 갔느냐?”
윤 오월 중순에 접어든 날씨는 완연히 여름이 되어 푹푹 쪘습니다. 그래도 낮이 되면 뒤주 틈으로 광선이 들어와 얼마간이라도 환했습니다. 그러나 그나마 며칠 지난 후에는 아주 캄캄해 졌습니다. 그동안 임금이 틈 있는 데를 막고 또 뒤주 좌우를 풀을 쌓아놓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뒤주 안은 화끈화끈 찌는 듯 더웠습니다. 세자는 처음에는 분에 못 이겨 배도 고프지 않았으나 사흘 되는 날부터 배가 고파 말도 안 나왔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그대로 죽을는지 알 수 없어 죽음에 대한 공포심이 엄습하여 왔습니다. 그럴 때마다 몸이 으스스 떨리며 지옥과 염라대왕이 손을 내밀고 덤벼드는 듯 했습니다. “아이 무서워, 내가 전생에 무슨 죄가 많아 이 모양이 되었나.” 세자는 이런 생각이 들 때마다 몸이 오싹오싹 떨렸습니다. 그리고 정신이 혼미해 오는 것이었습니다. 세자는 피맺힌 한과 절규를 남기고 이레 되는 날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영조 임금은 뒤늦게 세자를 죽였던 것을 후회하고 사도세자(思悼世子)라는 시효를 주었습니다. 사도세자의 시시신은 융능(隆陵)이라 하여 경기도 수원에 묻혔지만 그 원혼이 안주할 수 없었던지 무안군 운남면 동암 땅에 나타났습니다. 무안군청 소재지에서 사십 리. 운남면 소재지에서 십여 리 거리에 있는 이 갯마을은 50여 년 전까지 해안 2킬로미터까지 백사(白沙)가 깔리고 해당화가 만발해 명사십리(明沙十里)라 불렸습니다. 지금은 김해 김씨(金海金氏), 김해 허씨(金海許氏)등 25여 가구가 살고 있지만 200년 전에는 성씨(成氏), 박씨(朴氏), 이씨(李氏)가 주로 살았다고 합니다. 사도세자의 아버지 영조가 죽고 세자의 아들 정조가 왕위에 오르던 1777년 동암 마을 사람들 꿈에 사도세자가 나타났습니다. 하얀 돛을 단 배 한 적이 동암 마을 앞에 닿더니 흰 도포를 입은 귀공자 한 사람이 배에서 내려 뒷동산으로 유유히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위풍은 당당했고, 가는 길에 멧새와 해조들이 수없이 모여들어 주위를 비상했습니다. 어디서 모여들었는지 노루와 산토끼 한 무리도 귀공자 주위를 꺼억 거리며 따라다녔습니다.
귀공자는 산 정산에 오른 다음 한양종묘를 향해 무릎을 꿇고 가슴으로부터 솟구치는 긴 오열을 쏟아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범상치 않은 나그네와 갑자기 모여든 짐승 무리를 보며 별천지에라도 온 듯 어리둥절하였습니다. 나그네는 울음을 그치고 한동안 주위 풍광을 살펴 본 뒤 마을 사람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나는 뒤주 속에서 억울하게 죽은 사도세자다. 원한이 뼈에 사무쳐 현재 유택인 융능(隆凌)한 곳에만 머무를 수 없어 강산을 떠돌다가 이곳에 이르렀는데 이 곳 풍광이 너무 아름다워 내 혼이 머물기로 작정했으니 그리들 알라.” 잠에서 깨어나니 꿈에서 들은 말이 생생했습니다.
이튿날 동암 사람들은 이상한 꿈 이야기를 했는데 저마다 같은 꿈을 꾸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모두들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 꿈은 밤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계속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현몽이 계속 되는지라 이는 분명히 사도세자의 원혼이 동암 마을에 정식으로 모시기로 결정했습니다. 영험한 무당을 불러 굿을 하고 그의 넋을 부른 뒤 단(壇)에 정중히 모시고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제사는 매년 음력 정월 상순 정일(丁日)에 계속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세월이 흐르고 흐르는 동안 제사를 모시는 마을 사람들의 정성이 시들해지다가 결국은 제사를 폐하고 말았습니다.
이 탓이었든지 한발이 해가 계속되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가 없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돌림병까지 창궐하여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마을회의를 여러 번 거치고 궁리에 궁리를 거듭했으나 묘안이 또 오르지 않았습니다. 하다못해 유명한 점쟁이를 찾아가 점을 본 결과 산신령의 쉼터로 사용하는 뒷동산 봉우리 정점에 묘를 썼는데 이 묘 때문에 산신령이 노했으니 당장 묘를 이장하고 산신령을 달래는 큰 굿을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계속되는 한발로 끼니 잇기가 힘듦에도 아껴 두었던 씨 나락까지 거출하여 점쟁이 말대로 묘를 이장하고 굿을 성대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도 아무 효험이 없는 듯 재앙은 계속 마을을 괴롭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연유를 몰라 한숨만 귀고 있는데 다시 마을 사람들의 꿈마다 사도세자가 나타났습니다.
“내가 너희 선대에 한 말을 벌써 잊어버린 채 내 영혼 하나 위로한 줄 모르고 엉뚱한 짓만 하고 있으니 재앙을 당하는 것도 당연하다.” 마을 사람들은 회의를 열고 뜻을 모아 허물어진 단을 다시 수축한 후 잘못을 빌고 정선을 다하여 제사를 지냈습니다. 이 해가 지금으로부터 130여 년 전인 고종 11년(서기1873년) 이었습니다. 동암 사람들이 단을 수축할 때 손이 없다는 한식일 을 택했고 당일 제사를 지냈으므로 이 때부터 사도세자 제삿날은 한식일로 바뀌었습니다. 단을 모시고 지내던 제사를 서기 1918년 들어서는 조그만 묘당을 지어 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마을 제(祭)형태를 벗어나 면제(面祭)로 지냈는데 제사 때는 면내에 거주하는 많은 유림들이 참여한 가운데 면장이 제주가 되어 거행하였으나 근래에는 무안군수가 제주로 참여하는 행사로 커졌습니다. 강대익 군수 재임 때에는 군비(郡費)와 지방 유지들의 성금을 모아 묘당 앞에 장조황제 동암묘비를 세웠으며, 그 후로도 군비를 보조받아 묘각을 수리하여 국태민안과 마을안녕을 빌었습니다.